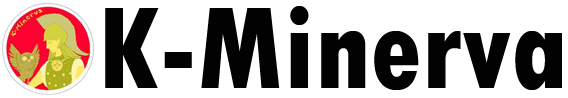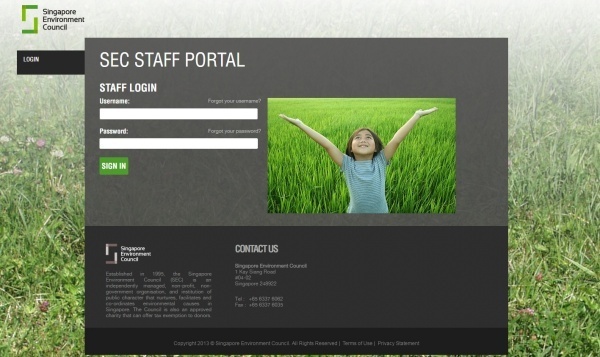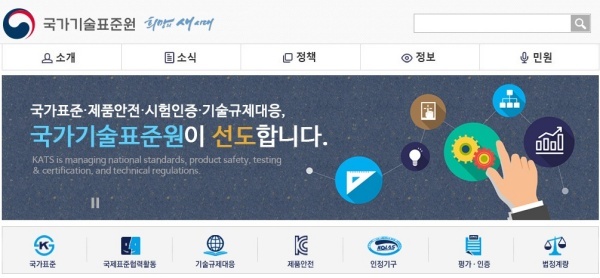[한국경제 침몰하는가] (45)국가통합인증마크(KC),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인가 정부를 위한 이익관리인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이미지(출처 :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에 안전마크로 잘 알려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의류, 장신구, 가구 등 대부분이 해당된다.
여기에 국내 소매업계는 KC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해당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업계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전을 위한 인증마크가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이익편취와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목적이 뚜렷한 만큼 부작용도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한국의 KC 관련법안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사례를 통해 진정한 안전인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 2017년 1월 전안법 시행...안전획득·소비자권리 vs 이익편취·물가상승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월 해당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적용대상을 의류,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영업부담 완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KC가 부착된 다양한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과 더불어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됐던 만큼 국민적 신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점이 법안의 목적성이 부재된 가장 큰 이유다.
한 예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해당업체의 제품에도 KC가 부착됐다. 이외에도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살만한 제품은 비일비재하다.
한편 중소형 소매업계에서는 KC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상공인들은 판매할 제품이 줄어들고 사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증비용의 발생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물가도 서서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 홈페이지
◈ 싱가포르·일본 - ‘규제적 장치 + 사회적 가치’ 고려한 안전인증
한국의 안전인증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다음에 살펴 볼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규제적 장치’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첫째, 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SEC)에 따르면 2017년 펄프와 종이제품에 대한 '환경마크(eco-labelling)' 기준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기준뿐만 아니라 산림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벌목, 산불유도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 일본 식료품업체인 아지노모토(味の素)에 따르면 2016년 12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팜유를 사용해 제조한 상품을 적극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팜유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벌채과 아동노동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바른 생산환경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한 인증인 셈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일본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려는 자세가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 정부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국민적 신뢰 부재된 법안은 STOP! 진정한 안전인증법안 마련해야 할 때
지금까지 한국의 KC 관련법안과 일부국가의 안전인증 사례를 살펴봤다. 선진국과의 정치적 발전성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우선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됐다는 점이 쟁점의 주요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KC 획득은 소비자를 위해 분명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관련 종사자들과 관련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검사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시장의 윤리의식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검증비용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정치적 게이트와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전안법은 왜 시행되려고 할까. 한국정부는 안전인증의 본연의 목적을 살린 새로운 전안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