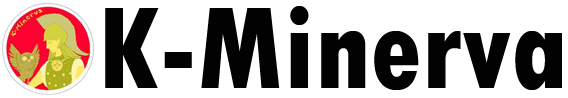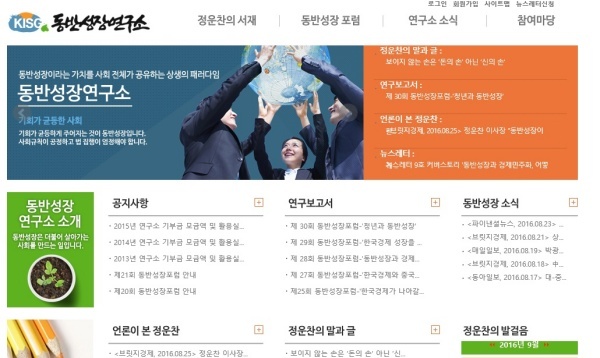[블랙기업과 화이트기업] (54)블랙기업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동반성장연구소 홈페이지
◈ 블랙기업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가가 청소년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블랙기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도 미래의 핵심 노동력인 청소년들이 악덕 고용주의 착취와 차별로 인해 직장에 근무하는 것을 두려워해 취업을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히키코모리(hikicomori)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사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히키코모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은둔자를 말하며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개인의 성격, 부모의 학대와 방치,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등이 주요인이지만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도 어둡다.
국가가 블랙기업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데 국가가 노동문제까지 개입하면 망하는 기업이 속출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 괜히 경영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할수록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블랙기업문제를 사회공론화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해결해야
그렇다면 국가가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블랙기업과 같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확보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블랙기업이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관료조차도 대기업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로조건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인력을 키울 대학이나 전문가는 많지 않다.
모두가 기득권인 대기업과 부딪힐 경우 자신의 미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블랙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세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업체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유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체면 좋다.
둘째, 블랙기업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정의하는 블랙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 일부도 블랙기업에 해당된다.
정부기관도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부서가 블랙기업은 아니더라도 화이트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조차도 불법적 관행과 강압적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누구나 사회발전을 위해 기꺼이 노동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좋은 노동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는 ‘1억총활약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일본경제의 부흥을 꿈꾼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여성, 노령층을 경제활동 현장으로 이끌어내 모두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좋은 기업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영자단체를 설득해 블랙기업 문제를 경영자들이 솔선해 해결하도록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어디까지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 막연하고 모호한 기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특정 기업에 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망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블랙기업이 음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치부하고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기업도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블랙기업 문제가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투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 블랙기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