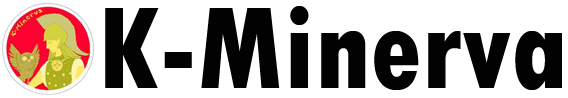1 / 1
" 판단기준"으로 검색하여,
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2-03-01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미국 특허권 이미지(출처 : 미국 특허청)
-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
일본 중전기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순이익은 1139억엔으로 집계됐다. 구조개혁을 통해 2년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도시바는 회사 외의 인력만으로 구성된 전략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주주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수 제안을 포함한 사업 및 재무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금융지주회사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연결순이익 1조엔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1 회계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 진행될 차기 중기경영계획의 목표이다. 2020 회계연도 예상 연결순이익인 7500억엔에서 약 30% 높인 수치이다. 일본 글로벌 전자대기업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1년 인공지능(AI)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개발을 진행하면서 운용 방법도 결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판단할 경우에 결과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로봇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
2021-05-18일본 글로벌 전자대기업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1년 인공지능(AI)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개발을 진행하면서 운용 방법도 결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판단할 경우에 결과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 개발 혹은 서비스의 보급이 진행되며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리스크 대응의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니그룹, 히타치제작소 등도 인공지능(AI)의 윤리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인공지능(AI)의 윤리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로봇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
▲미국 CIA의 윤리원칙과 윤리교육 내용(출처 : iNIS) ◈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의 윤리교육 내용윤리교육의 내용에 따라 직원의 준수의지가 달라지므로 윤리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윤리교육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내용을 참조해 기업의 윤리교육내용을 고민해 보자. 그림19에서 조직윤리의 원칙과 윤리교육 내용을 정리했다.CIA의 조직윤리의 원칙과 개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는 윤리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첫째, 성과평가와 승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비전(vision)과 도덕적 도전에 적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정보기관의 존재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국가안보라는 용어에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안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추세이다.국가안보를 위해서 살인, 파괴, 방화, 사회적 혼란, 정부의 전복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원들이 도덕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과의 평가체계를 세워야 한다.둘째, 직원 니즈(needs)변화의 민감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 도덕기준과 정보요원으로서 도덕기준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공해야 한다.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가치는 옳고 신세대의 가치가 잘못됐다고 평가한다.개인의 자신의 출신배경, 출신지역, 학력, 가족구성, 경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의 기준과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셋째, 반대에 대한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미션(mission)에 기반한 이상을 인식하고 토론할 기회를 준다.비전(vision)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한 것이 미션이다. 기존의 업무방식과 논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배경지식을 배울 수 있다.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가 있다. 천하의 호령하는 영웅도 혼자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릴 수는 없다.넷째, 실패에 대한 관용과 수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법률적 제재보다는 개인적 이익추구에 대한 논리를 습득하게 한다.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조직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 조직보다 개인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욕하면서 배운다’처럼 업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한국 속담이 이에 해당된다.마지막으로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헌신성을 제공하기 위해 성공, 실패사례의 논쟁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만든다.누구나 실패는 부끄러워하고, 기억하기 싫어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만큼 손해를 보고 사는 셈이 된다.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한다. 상급자나 선배의 의견에 순종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교훈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김영란법 제5조에 명시된 부정청탁의 종류(출처 : 법제처) ◈ 직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동일한 내용의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자신의 지식수준과 경험에 따라 이해의 깊이나 폭이 다르다. 윤리경영도 마찬가지이다.학력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성원은 도대체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윤리규범을 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윤리경영이 기업 내부에서 직원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이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 줘야 한다.윤리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면담하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회사를 위해서’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2가지 변명 다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해줬는지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성인인데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틀린 말은 아니다. 성인인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개인적 충정에 의해 비윤리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직원도 많이 만날 수 있다.하지만 정작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직원의 관점은 자신의 지식, 경험, 입장에서만 고려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과는 배치될 수도 있다.편협하거나 단기적인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직원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렵다.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고 충성심에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명백한 이상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 내부에 비슷한 유형의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채 재발하거나 반복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지, 조직에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지 못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윤리경영 제도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김영란법은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청탁을 어떤 범위까지 봐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현금과 같은 뇌물이 아닌 식사접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도 명백하지 않다.직무연관성을 현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직무연관성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도 숙제다.대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받는데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사후수뢰도 있다. 또한 기업이나 직업 브로커의 경우에는 현재 부탁할 일은 없지만 미래에 부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기업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과거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회사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은 처벌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법률제정으로 기업은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리규범을 새롭게 정리해 교육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직원의 돌출행동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윤리경영의 확립이 더 중요해졌다.대부분의 성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주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옳고 그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자신은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근절해야 한다.회사가 직원의 업무처리에 관련된 판단기준을 정해서 제공할 필요가 높은 것이다.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때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김영란법이 복잡하고 너무 광범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공정사회를 추구하는동반성장연구소 홈페이지 ◈ 블랙기업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가가 청소년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블랙기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한국에서도 미래의 핵심 노동력인 청소년들이 악덕 고용주의 착취와 차별로 인해 직장에 근무하는 것을 두려워해 취업을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히키코모리(hikicomori)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사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히키코모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은둔자를 말하며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비화됐다.개인의 성격, 부모의 학대와 방치,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등이 주요인이지만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도 어둡다.국가가 블랙기업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반발하고 있다.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데 국가가 노동문제까지 개입하면 망하는 기업이 속출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고용을 늘리는 것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 괜히 경영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할수록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블랙기업문제를 사회공론화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해결해야그렇다면 국가가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블랙기업과 같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확보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블랙기업이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정부관료조차도 대기업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로조건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인력을 키울 대학이나 전문가는 많지 않다.모두가 기득권인 대기업과 부딪힐 경우 자신의 미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블랙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가 자체적으로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세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외부 전문업체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유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체면 좋다.둘째, 블랙기업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일본의 시민단체가 정의하는 블랙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 일부도 블랙기업에 해당된다.정부기관도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부서가 블랙기업은 아니더라도 화이트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조차도 불법적 관행과 강압적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누구나 사회발전을 위해 기꺼이 노동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좋은 노동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일본의 아베총리는 ‘1억총활약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일본경제의 부흥을 꿈꾼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여성, 노령층을 경제활동 현장으로 이끌어내 모두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좋은 기업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셋째, 경영자단체를 설득해 블랙기업 문제를 경영자들이 솔선해 해결하도록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어디까지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 막연하고 모호한 기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젊은이들이 특정 기업에 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망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결론적으로 보면 블랙기업이 음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치부하고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기업도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블랙기업 문제가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투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 블랙기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
▲내부고발의 다양한 방법(출처 : 위키미디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 문제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그러나 내부고발을 연구하면서 내부고발자를 만나본 결과 대부분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이 일반 직원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았다.아직도 한국사회는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공개적으로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논의를 꺼린다. ◈ 내부고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발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과해야고발내용의 진위여부판단, 무기명 고발의 허용여부, 내부고발자의 처리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다. 첫째, 내부고발자의 고발내용을 의심하고 있다면 왜 의심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발자의 평상시 업무태도, 인상, 성(性), 인종, 민족성, 지역출신 등 주관적인 내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현장에서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감사나 윤리경영 사무국 직원들이 고발자의 직급이나 나이, 업무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내부고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둘째, 내부고발자는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스스로 고발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추정하거나 감정에 의해 허위의 내부고발을 방지하고 선의의 내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인 셈이다.내부고발이 상사나 경영진을 무고하기 위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상사의 인사평가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하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도덕적 판단기준이 상식 이하일 경우에 대처할 방법도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기업에서 모든 직원이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한다는 것도 선입견에 불과하다. ◈ 내부에서 신뢰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기명고발과 보상을 추진해야 효과적셋째, 내부고발을 기명으로 하도록 요구할지 여부이다. 무기명으로 할 경우 음해와 장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내부고발이 내부고발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명으로 할 경우 고발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내부고발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므로 기명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대부분의 기업에서 처음에는 무기명을 허용해도 고발처리가 잘 되고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기명고발이 늘어났다.따라서 기명고발을 처음부터 강제하기 보다는 내부에 신뢰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넷째,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내부고발자의 신원공개나 색출작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행위자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내부고발자 신분공개, 색출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감사부서나 인사부서가 더 암묵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다섯째, 내부고발로 인해 기업의 손실이 예방되었거나 이미지가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야 한다.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통해 조직에 중요한 일을 했고 조직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내부고발자가 고발내용에 연루된 경우에도 면책이나 처벌의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부패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 뇌물도 떡값이나 관행이라고 우기는 이상 부패는 사라지지 않아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성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관행’이다.과거의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체계화된 법률을 제정한 근대국가 이전까지 이러한 원칙이 통용됐다.관행이 관습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수단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관행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업이나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이들의 변명은 한결같이 ‘관행이다’라는 것이다.‘관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모든 구성원을 부정행위의 공범자 혹은 방관자로 치부해 버린다. 한국의 사회지도층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억압된 권력(勸力)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행사하던 권한(權限)을 민주화된 이후에도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웬만한 뇌물은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직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실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불행행위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적당하게 부정부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이 무섭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급에 따라, 조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 전관예우가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국민은 바보다부패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도 특권의식에서 출발한다.경찰은 힘이 없어 발각돼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나 판사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만 특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검사나 판사는 퇴직 때까지 보장된다.퇴직 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웬만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최근 발생한 법조비리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도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은 법원은 전관예우를 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보라서 자신들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권력은 패망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회지도층은 부패하면서 국민보고 먼저 투명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용인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마찬가지로 오너와 경영진은 부정행위로 법원과 감옥을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직원들보고 윤리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상사는 권한을 행사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부하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