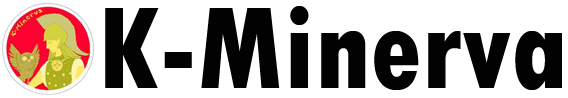[윤리경영] (34)뇌물과 떡값도 관행이라고 우기고 면죄부를 주면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사라지지 않아
◈ 뇌물도 떡값이나 관행이라고 우기는 이상 부패는 사라지지 않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성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관행’이다.
과거의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체계화된 법률을 제정한 근대국가 이전까지 이러한 원칙이 통용됐다.
관행이 관습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행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업이나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이들의 변명은 한결같이 ‘관행이다’라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모든 구성원을 부정행위의 공범자 혹은 방관자로 치부해 버린다.
한국의 사회지도층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억압된 권력(勸力)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행사하던 권한(權限)을 민주화된 이후에도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웬만한 뇌물은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직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실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불행행위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적당하게 부정부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이 무섭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급에 따라, 조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 전관예우가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국민은 바보다
부패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도 특권의식에서 출발한다.
경찰은 힘이 없어 발각돼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나 판사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만 특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검사나 판사는 퇴직 때까지 보장된다.
퇴직 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웬만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도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은 법원은 전관예우를 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보라서 자신들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권력은 패망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은 부패하면서 국민보고 먼저 투명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용인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마찬가지로 오너와 경영진은 부정행위로 법원과 감옥을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직원들보고 윤리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
상사는 권한을 행사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부하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성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관행’이다.
과거의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체계화된 법률을 제정한 근대국가 이전까지 이러한 원칙이 통용됐다.
관행이 관습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행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업이나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이들의 변명은 한결같이 ‘관행이다’라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모든 구성원을 부정행위의 공범자 혹은 방관자로 치부해 버린다.
한국의 사회지도층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억압된 권력(勸力)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행사하던 권한(權限)을 민주화된 이후에도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웬만한 뇌물은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직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실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불행행위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적당하게 부정부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이 무섭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급에 따라, 조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 전관예우가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국민은 바보다
부패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도 특권의식에서 출발한다.
경찰은 힘이 없어 발각돼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나 판사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만 특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검사나 판사는 퇴직 때까지 보장된다.
퇴직 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웬만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도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은 법원은 전관예우를 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보라서 자신들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권력은 패망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은 부패하면서 국민보고 먼저 투명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용인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마찬가지로 오너와 경영진은 부정행위로 법원과 감옥을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직원들보고 윤리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
상사는 권한을 행사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부하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